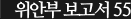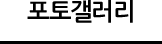할머니들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기자에게 단지 '위안부 피해자'라는 집합명사였다. TV 등 언론에서 마주한 할머니들은 결기 센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외치는 한(恨) 많은 존재였다. 55명의 할머니들을 기어코 다 만나야겠다고 결심한 건 '위안부'로 뭉뚱그려진 할머니들의 개별적 삶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싸잡아 위안부가 아니라 '길원옥' '김복동'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았으면 했다. 할머니들의 현재 모습을 담은 '소녀들의 삶' 갤러리는 '위안부 보고서 55'로 설명되지 않는 할머니들의 일상을 포착해 낸 결과물이다.
조르고 조른 끝에 기자와 마주한 할머니들은 '보통'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 마포 평화의집에서 생활하는 길원옥 할머니는 아들의 가족사진을 올려다보며 아들의 성장을 기특해했고 또 그리워했다. "한 대 태워도 되겠나?" 김복동 할머니는 부산 다대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남으려했던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수요집회에 매번 참석하는 사진기자는 "복동 할머니가 선글라스를 벗은 모습도, 담배 피우는 모습도 생소하다"고 했다.
경남 마산의 김양주 할머니 집에는 평양으로 시집간 친언니의 결혼식 사진, 부산으로 출가한 수양 딸의 결혼식 사진 등 사진첩이 많았다.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을 할머니는 사진으로 붙잡아 뒀다. 치매 탓에 그 기억마저 날로 흐릿해져가고 있다.
남해에 살고 있는 박숙이 할머니 손은 유독 거칠고 투박했다. 1남2녀를 홀로 키우느라 베 짜고 침 놓았던 할머니 손은 그렇게 지난 세월을 그대로 보여줬다. 물 마를 새 없었던 손에 봉숭아 물을 들이던 날, 할머니는 열 손가락을 바라보며 연신 "예쁘다, 예쁘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면서 가족ㆍ친구 등과 아무런 준비 없이 헤어졌던 때문일까. 박숙이ㆍ이효순ㆍ김양주ㆍ김복득 할머니는 취재진을 배웅하면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돌아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워할 사람을 한 명 더 보태줬구나'란 생각에 공연히 목이 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