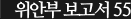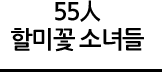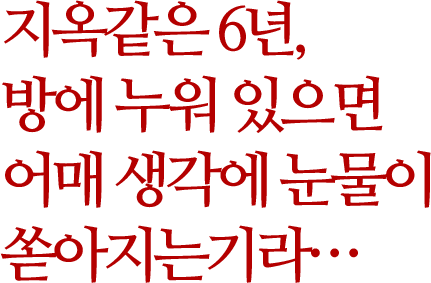 "그 좁은 위안소 방에 눠 있으면 부모 형제 생각이 절로 났제. 기약없이 떠나왔으니 울 어매는 나를 얼마나 찾았을거여. 남해 화방사서 빌고 또 빌고 있을 어매 생각을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기라. 그래 내 위안소서 눈물 젖은 두만강을 자주 불렀제. 떠나간 그 배는 어데로 갔소. 이런 가사 안 있나? 여기서 떠나간 배는 다신 안 오는 배다." 구성지게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던 할머니는 노래 구절구절이 꼭 자기 얘기 같다고 했다.
"그 좁은 위안소 방에 눠 있으면 부모 형제 생각이 절로 났제. 기약없이 떠나왔으니 울 어매는 나를 얼마나 찾았을거여. 남해 화방사서 빌고 또 빌고 있을 어매 생각을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기라. 그래 내 위안소서 눈물 젖은 두만강을 자주 불렀제. 떠나간 그 배는 어데로 갔소. 이런 가사 안 있나? 여기서 떠나간 배는 다신 안 오는 배다." 구성지게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던 할머니는 노래 구절구절이 꼭 자기 얘기 같다고 했다.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걸쳐 만난 박숙이(92) 할머니는 기자가 예의를 갖추려고 무릎을 꿇자 대뜸 호통을 쳤다.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걸쳐 만난 박숙이(92) 할머니는 기자가 예의를 갖추려고 무릎을 꿇자 대뜸 호통을 쳤다.“내 얘기 좀 해보까.” 벽에 기대있던 할머니가 몸을 일으켰다. 할머니가 열여섯 살 때(1937년)였다. 한 살 터울 이종사촌 언니와 남해 고유면 바닷가에서 일본군인 2명이 난데없이 검은차에 태워 끌고 갔다. "고동 잡을라고 바다에 갔다가 왜놈들한테 잽혀갔거든? 두 놈이 덮어놓고 잡아끌고 올라갔다 아이가."
그때 함께 붙들린 조선처녀는 10여명이었다고 할머니는 기억했다. 앉아서 우는 소리와 말소리가 뒤섞여 트럭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일본 나고야에 당도하자 감금생활이 시작됐다. 한 일주일 지났을까. 난데없이 화장을 곱게 시키고 일본 옷을 입혔다고 한다. "우리 조선 옷을 싹 벗어뿌리고 일본 옷을 입히는 기라. 일본 옷을 입히더만은 화장을 싸악 시키는 거라."
배타고 도착한 곳은 텐트를 개조해 만든 만주위 위안소였다. 이튿날부터 예고없이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할머니를 '준꼬'라고 불렀다. 의지와 상관없이 할머니는 이름을 잃어버렸고 순결을 잃었다. 일본말을 배우라고 강제했다. 한사코 거부했던 할머니는 그럴때마다 얻어맞았다. "너 말 안 들으면 직인다 그래, 딱 때렸는데 여기 허리가 뿐질러져 뿐기라." 당시의 상황을 전하면서 할머니는 몸서리쳤다. 할머니는 이 대목을 이야기하며 손을 잡아 끌어 등 언저리를 만져보게 했다. 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지옥같은 위안소 생활은 상해에서도 이어졌다. 자그마치 6년이었다. "군인들 가는 데로 또 데꼬 댕겨. 하루 열명도 좋고 스무명도 좋아. 그러니까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지…."
1945년 일본의 패전 기색이 짙어지자 탈출을 도모하는 조선처녀들이 많았다. 할머니 이종사촌 언니도 밤에 탈출을 감행했지만 붙들리고 말았다. 할머니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했다. 무서워 벌벌 떠는 할머니에게 다른 조선 처녀 한 명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면서 도망치자고 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지만 곧바로 고향 땅을 밟진 못했다.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 중국에서 홀애비를 만나 몇 달 살림을 살았다. 10~20원 던져주는 푼돈을 악착같이 모아 꿈에 그리던 고국땅을 밟았다. 1948년이었다. 고향 떠난 지 11년만이었다.
 그런데 엉뚱하게 도착한 곳은 고향인 남해가 아니라 부산이었다. 남해라고 발음했으나 남해를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무지함 때문이었다. 어려서 오빠 어깨 너머로라도 글을 깨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머슴아는 하늘이고 가시내는 땅이다. 여자들이 글 배우면 건방지다고 했다 아이가." '아부지'라고 불러만 봤지 이름도 모르던 아버지는 그렇게 교육시켰단다.
그런데 엉뚱하게 도착한 곳은 고향인 남해가 아니라 부산이었다. 남해라고 발음했으나 남해를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무지함 때문이었다. 어려서 오빠 어깨 너머로라도 글을 깨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머슴아는 하늘이고 가시내는 땅이다. 여자들이 글 배우면 건방지다고 했다 아이가." '아부지'라고 불러만 봤지 이름도 모르던 아버지는 그렇게 교육시켰단다."부산역에 앉아있는데 어떤 할매가 오더니 갈 데 없으면 식모 살랑가 해서 좋소 하고 따라갔제." 산에서 3년 동안 식모살이를 했다. "어무이가 화방사에 간다고 한 게 생각난기라. 그래서 화방사가 있는 남해가 고향이라는 것을 알았제." 고향에 당도하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오빠는 전라도로 갔다고 했다. 피붙이 없는 고아가 된 것이었다.
"위안부 6년 있다 나왔제. 나와서 식모 3년 살았제. 고향에 온께로 외롭다 아이가. 근데도 위안부 출생이 되서 시집은 무슨 가봤자 아도 못 낳아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기라." 할머니는 결혼을 단념했다.
홀홀단신 아이 셋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 삼베 짜는 일을 배우고 침 놓는 것도 익혔다. "배 아픈사람 배도 만져주고 다리 아픈 사람 침도 놔주고 안해본 일이 없다 아이가. 내 위안부 출생이라 기술도 없제 뭐 먹고 살꼬."
위안부 출신이란 딱지는 평생 할머니를 따라 다녔다. 할머니 왼쪽 손목에는 희미하게 상처 자국이 있다. 손목을 두번 그었다고 했다. 구타와 겁간의 후유증 탓에 거동도 불편하다. "마음대로 몬 일어나서 걸음도 옳케(바르게) 몬 걷고." 할머니는 유모차와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다. 지난해 5월 할머니는 12년 만에 남해 밖을 벗어났다. 할머니를 돌보는 김정화 남해여성회 대표와 함께였다.
할머니는 아흔이 되서야 위안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2012년 피해자 등록을 했다. 뒤늦게 커밍아웃 한 것은 순전히 자식 때문이었다. 위안부 출신임이 알려져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느그 엄마 위안부 출생이다, 위안부 출생이다 이래 싸면 핵교 못 다닐 꺼 아이가."
아들 딸이 출가하고 손자 손녀가 장성해 남해를 떠났을 때야 할머니는 비로소 피해자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막상 동사무소를 찾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는 한다.
할머니는 같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면 안쓰러우면서도 울화가 치민다. "좀 잘 살지. 다들 만나면 정신들이 없다." 피해 할머니들 대다수는 위안소 생활로 얻은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거나 치매를 앓고 있다. 가족과 단절돼 살거나 곤궁하게 사는 할머니들도 많다. "다른 위안부 할매들 보면 불쌍해. 돈 애낀다고 먹는 거 못 먹고. 난 답답하게 안 살아, 살면 을매나 산다꼬."
할머니는 그래서 옷도 자주 사입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도 항상 음식을 꽉 채워 놓는다. 기자가 찾은 날에도 할머니는 주먹만한 삶은 감자를 내오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양파즙을 따라줬다. 냉동실에 대하가 한 가득 있다며 냉동실 문을 열어보라고도 했다.아들 딸이 출가하고 손자 손녀가 장성해 남해를 떠났을 때야 할머니는 비로소 피해자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막상 동사무소를 찾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는 한다.
할머니는 같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면 안쓰러우면서도 울화가 치민다. "좀 잘 살지. 다들 만나면 정신들이 없다." 피해 할머니들 대다수는 위안소 생활로 얻은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거나 치매를 앓고 있다. 가족과 단절돼 살거나 곤궁하게 사는 할머니들도 많다. "다른 위안부 할매들 보면 불쌍해. 돈 애낀다고 먹는 거 못 먹고. 난 답답하게 안 살아, 살면 을매나 산다꼬."
할머니는 이날 열 손가락에 빨갛게 봉숭아 물을 들였다. 할머니는 손가락을 들여다보며 연신 '예쁘다 예쁘다'고 했다. 위안부 전적이 부끄러워 유독 본인에게 인색했던 할머니는 70년이 넘어서야 자신에게 '예쁘다 예쁘다'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핵생들한테 역사 이야기 하고 하면 속 시원해." '부끄럽다'에서 '역사의 산증인'으로 당당히 선 박숙이 할머니. 할머니 방에 걸린 액자에 씌인 글씨가 할머니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고 있었다. '상처 많은 꽃이 더 향기롭다.'